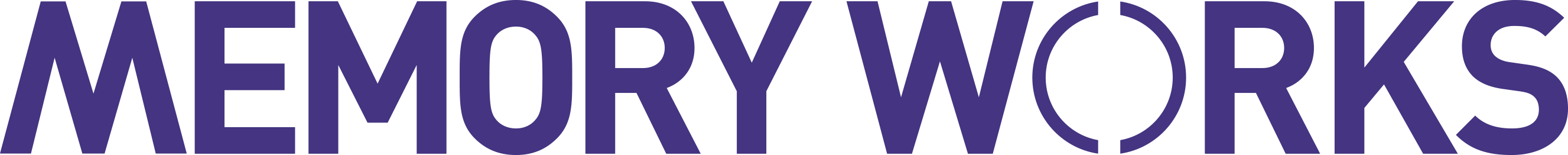[고충환 미술평론] 박종필의 회화 조화, 생명을 얻고 싶은 인공물들 / 고충환
박종필의 회화
조화, 생명을 얻고 싶은 인공물들
Between the Fresh no.40 163x97cm oil on canvas 2013
고충환(Kho, Chung-Hwan 미술평론)
케이크가 있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음식이다. 비록 지금은 흔한 음식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축일이나 생일처럼 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음식이다.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라기보다는 보라고 만든 음식 같아서 선뜻 손이 가지지가 않는, 이런저런 의미가 토핑처럼 더해진 음식이다. 딸기와 포도, 젤리와 사탕을 듬뿍 얹고 그 위에 시럽을 흩뿌린 케이크를 한입 베어 문다. 그렇게 입안에서 살살 녹는 케이크 조각 사이사이로 포도 알갱이며 젤리가 씹힌다. 그런데 체리 아님 젤린 줄로만 알았던 것의 형태가 왠지 낯설다. 사람 얼굴이다. 사람 얼굴 형상의 젤리? 젤리를 씹은 줄 알았는데, 사람 얼굴을 먹었다? 이 무슨 시추에이션인가. 반전이다. 바로 여기에 박종필의 그림이 위치해 있고,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고, 유사한 소재를 공유하는 다른 작가며 그림들과의 차이가 있다.
작가는 낯설게 하기 내지 소외효과며 소격효과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소격효과는 아방가르드의 핵심전략으로서 현상의 이면읽기 내지 행간읽기에 연동돼 있다. 현상 내지 사물대상이 겉보기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그 속뜻을 주지시킨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에포케와도 통한다. 학습을 통한 내재화와 관습적으로 굳어진 선입견의 지평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평을 걷어내는 것인데, 그렇게 드러나 보인 사물의 본질이 선입견과는 달라서 낯설고 낯설게 하기다. 그렇다면 케이크는 무슨 낯 설은 속뜻이라도 숨기고 있다는 말인가. 바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케이크 속에 자본주의의 욕망이 숨겨져 있다고 본다. 아님, 같은 이야기지만 케이크를 빌려 자본주의의 욕망을 주지시키고 싶다. 논리적으로 비약을 해보자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케이크지만 정작 실제로 먹어보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싶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케이크를 바로 자본주의의 욕망의 기호로서 제안한 경우로 볼 수가 있겠다. 자본주의의 욕망은 유혹적이고 치명적이다. 그 욕망은 욕망을 충족시켜 욕망을 완성하는 욕망의 완결판이 아니다. 다른 욕망 내지 더 큰 욕망을 불러들이기 위한, 그리고 그렇게 욕망의 끊임없는 재생산을 위한 계기로서만 욕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작가는 그렇게 욕망하고 욕망 받는, 먹고 먹히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그려놓고 있었다. 바로 케이크를 매개로 한 카니발리즘(식인)의 세계를 그려놓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달콤함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기꺼이(?) 녹아 없어져줄 용의가 있는, 버젓이 나비넥타이까지 맨 캔디맨을 그려놓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불을 밝힐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를 태워 없앨 준비가 돼 있는 캔들맨을 그려놓고 있었다.
이로써 작가의 그림은 자본주의를 매개로 한 욕망과 결핍, 욕망과 희생(엄밀하게는 희생이라기보다는 희생양)의 상호 관계성(짝패?) 문제를 건드린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유래한 상징의 지점들, 이를테면 각각 캔들(아님 캔들맨)과 캔디(혹은 캔디맨) 그리고 케이크로 변주된 자본주의의 욕망의 기호는 이후 근작에서 재차 꽃으로 환생할 것이었다.
그리고 작가는 언젠가부터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 만큼 꽃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편이었다. 그래서인지 작가의 작업실엔 각종 꽃들 천지였다. 특히 이름마저 생소한 열대식물이나 희귀식물들을 보면 어렵사리 구해놓곤 했는데, 이름도 생소하고 생김새도 생경했다. 마치 조화 같은 생화를, 인공물 같은 자연물을 보는 느낌이랄까. 분명 생화들이고 자연물이지만 왜 조화며 인공물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여기서 어떤 꽃을 생화 아님 조화로 느끼는 것은 실재 유무와는 별개로 인식의 문제에 연동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가 꽃을 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생화와 조화의 경계에, 자연물과 인공물의 경계에 있었다. 그리고 그 경계와 관련한 인식론적 문제에 있었고, 자본주의의 욕망과 상품화의 논리 그리고 여기에 미디어 메커니즘이 그 인식에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었다.
이미지는 실재 그대로의 반영물이 아니다. 아니, 아예 반영물일 수가 없다. 실재 그대로의 영락없는 닮은꼴이야말로 알고 보면 이미지의 함정일 수 있다. 이미지는 실재를 변질시킨다. 이미지는 실재보다 화려하고 감각적이고 매혹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재보다 이미지를 더 친근하게 느끼고, 그런 만큼 실재를 이미지로 대체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대체된 실재가 또 다른 실재며 그 자체 자족적인 실재로서 제시된다(이미지는 모든 것을 삼킨다. 심지어 실재마저도). 작가의 꽃 그림은 바로 그런 문제를, 말하자면 실재와 이미지와의 관계며 대체 문제를 건드린다.
작가는 Between the Fresh라는 주제 아래 아우른 일련의 꽃 그림들을 매개로 이런 경계 문제며 인식론적 문제를 다룬다. Between the Fresh? 신선한 것들 사이? 살아 있는 것들 사이? 생화들 사이? 아마도 일정정도 이 모두를 의미할 것이다. 말하자면 작가는 생화들 사이사이에 조화들을 그려놓고 그 조화들을 가려내 보라고 주문한다. 일종의 숨은그림찾기에 초대한 것이다. 그 실체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리는 극 사실을 구사하는 작가의 기법이며 경향으로 보아 쉽게 가려질 것 같은데, 사실을 말하자면 죽어도 가려낼 방법이 없다. 무슨 일인가. 작가는 그저 생화를 생화답게 그리고 조화를 조화답게 그렸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논리적으로 그 차이가 즉각적으로 인지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생화를 생화답게 그리고 조화를 조화답게 그려서 생화와 조화의 차이를 견지했음에도, 결과적으론 그 차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주문 자체가 혹 함정은 아닐까. 말하자면 애초에 작가는 실재와 차이 없는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차이를 가려내보라고 주문한 것은 아닐까. 이로써 궁극적으론 실재와 이미지며 실재와 이미테이션 사이에 어떠한 경계도 차이도 없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아닐까.
이미지는 실재가 그립다. 그 생생함이 그립고, 그 살아있음이 그립고, 그 생명이 그립다. 그래서 이미지는 실재가 되고 싶고 실재의 지위를 탈취하고 싶다. 바로 자본주의의 욕망이 완성되는 지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는 이미지를 판다. 실재를 대체한 이미지를 파는 것인데, 사실을 말하자면 실재를 대체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판다. 그래서 그 완성은 반쪽짜리 완성이며 불구의 완성일 수밖에 없다. 이미테이션은 죽어도 실재의 생생함을, 살아있음을, 생명을 탈취하지도 대체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어쩌면 자본주의의 욕망은 실재에 대한 그리움 위에 정초되는 것일지도 모른다(욕망은 결핍의 짝패다. 욕망의 끊임없는 재생산과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짝패다). 작가의 숨은그림찾기는 바로 이런 실재를 그리워하는 이미지의 운명이며 상품의 한계 문제를 건드린다.
한편으로, 작가의 그림의 밀도감을 높이는 계기가 바로 반전이다. 사물현상이 겉보기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며, 그렇게 속뜻을 드러내 겉 뜻과 대비시킬 때 선입견과 충돌하는 것이 반전이다. 이를테면 전작에서 체리 혹은 젤린 줄 알고 씹었는데 알고 보니 사람 머리 형상이었다는 것에 반전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무슨 수로도 생화와 조화를 구별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미지 혹은 이미테이션이 실재를 대체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반전이 일어난다. 바로 Between the Fresh 시리즈와 Between the Fresh after 시리즈를 대비시킬 때가 그렇다. 신선한 것이 여전히 신선할 때, 살아있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생화와 조화는 구별되지가 않는다. 말하자면 조화는 생화가 여전히 신선한 순간을, 그리고 나아가 아예 가장 신선하고 생기발랄한 순간을, 말하자면 생화의 생화다움이 정점을 찍는 순간을 흉내 낸 것이며, 그렇게 순간으로서 영원을 흉내 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살아있는 것들은 그렇지가 못하다. 시간이 지나면 생기발랄한 것들은 시들고, 살아있는 것들은 죽기 마련인 것이 생명의 이치이며 순리이다. 그렇게 생화가 시들고 죽으면 마침내 생화와 조화는 구별된다. 생화는 시들었는데, 조화는 여전히 생기발랄한 순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화는 시간을 살고, 조화는 순간을 산다(만약에 조화를 일종의 유사생명이며 의사생명에 비유할 수가 있다면). 그 순간이란 뭔가. 바로 살아있는 것들의 정점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멈춘(죽은?) 박제화 되고 화석화된 순간이기도 하다. 여기서 다시 실재를 그리워하는 자본주의 욕망이 변주된다. 바로 사물대상이 가장 화려했던 순간을 흉내 내 보지만, 그렇게 생명과 젊음과 청춘을 제 것으로 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순간을 탈취해 영원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저 조화가 결코 생화가 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조화가 다만 조화에 지나지 않을 뿐임이 드러날 뿐.
이처럼 작가의 꽃 그림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볼 때, 생화를 흉내 낸 조화의 생기발랄함이며 이미지의 유혹적인 자태가 주는 감각적 쾌감을 자아낸다. 그리고 어쩌면 이보다 더 결정적일 수 있는 것이, 모든 시간과 더불어서 시들고 부패하고 죽어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생명 있는 것들의 존엄을 무언으로 웅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웅변은 죽어가는 것들이며 부패하는 것들 옆에 정점의 순간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놓아 대비시킨 것에서 더 강화되고 더 감동적으로 와 닿는다.
-------------
메모리웍스
02-541-6806
------------
'[ 전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술평론 윤우학] 한기주의 초사실주의 / 윤우학 (0) | 2014.02.18 |
|---|---|
| [미술평론 독립큐레이터 황정인] 장재철의 미답의 공간을 끌어안은 신체의 궤적 (0) | 2014.02.18 |
| [박종필] 꽃그리는 미술작가 박종필 (0) | 2014.02.17 |
| [이승희]예상을 뛰어 넘은 예상 이승희 작가 (0) | 2013.12.30 |
| [김대관] 김대관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대관 작가의 독일 히스토리 (0) | 2013.12.06 |